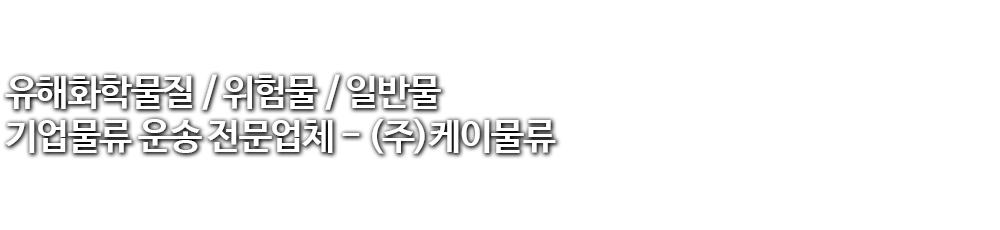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입회사는 물류창고에 기준에 의한 안전방화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매장 역시 안전 캐비닛 이외에도 보관을 위한 안전방화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관련 안전방화시설은 반드시 1층 또는 2층에 갖춰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위반하면 처벌 과태료(해당 제품 수량 X 50만원)가 부과된다. 이 규정 역시 미국과 유럽 어디에도 방화시설과 관련한 특별한 의무사항이 없다.
화장품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청와대 규제 및 안전 담당부서 관계자는 대한화장품협회와 소방청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화장품협회 쪽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화장품을 안전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하느냐”, “화장품을 위험물 취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제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소방청과 과도한 규제라는 화장품협회 쪽의 공방이 오갔고, 결국 청와대는 소방청에 “2019년 12월까지 화장품에 대해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보류하고 관련 부분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3월 국회의결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이들의 위법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무분별한 위험물질 취급을 규제해, 대형 화재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겐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도 전반적인 규제 강화 쪽으로 연이어 개정됐다. 소방당국은 1년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다.